
남의 잔치가 한창이다.
27일 개막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 31일 현재 한국 선수단은 노메달이다.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첫 메달을 은근히 기대했지만 소식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개최국의 이점은 많다. 시차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운동장이나 환경 등에 적응하기 용이하다.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도 등에 업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육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의 메달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홈의 이점은커녕 세계 수준과의 격차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선수단에서 메달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남자 경보 20km의 김현섭(26·삼성전자)은 6위에 올랐다. '10-10(10개 종목 10위권 진입) 프로젝트'에 따라 목표는 성공했지만 2% 아쉽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최윤희(25·SH공사)도 올해 6월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4m40)에 타이를 이루는데 만족했다. 남자 100m의 김국영(20·안양시청), 남자 110m 허들의 박태경(31·광주시청) 모두 마찬가지다.
한국은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1회 대회부터 출전하고 있지만 단 1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다. 2007년 오사카대회에서 번외 경기인 남자 단체 마라톤이 2위를 차지한 것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메달 집계에서는 빠졌다.
가장 좋은 성적은 1993년 슈투트가르트대회에서 남자 마라톤의 김재룡(45)이 4위에 오른 것이다. 이밖에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이진택(39)이 1997년 아테네대회, 1999년 세비야대회에서 결승에 나가 8위와 6위에 올랐고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26·광주시청)이 2007년 오사카대회에서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까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위 이내에 진입한 것은 4번이 전부다.
한국 육상의 부진을 신체 조건의 한계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이미 금메달 1개씩을 따내 육상 강국들 틈에서 자존심을 세웠다. 중국은 동메달도 하나 있다. 일본의 경우, 금메달을 목에 건 무로후시 고지(37)가 혼혈이기는 하지만 여자 100m에서 79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한 후쿠시마 치사토(23)도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강했다. 2009년 베를린대회까지 중국은 통산 금메달 9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를 따내 집계에서 17위에 올랐고 일본은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1개를 따 35위에 랭크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축구월드컵 등 굵직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세계 유수의 스포츠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이 육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아직 희망은 있다. 남자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 출전하는 김덕현(26·광주시청)은 컨디션에 따라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주다.
역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개최국이 단 1개의 메달도 따지 못한 적은 1995년 스웨덴 예테보리대회, 2001년 캐나다 에드먼턴대회 두 번 뿐이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제공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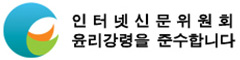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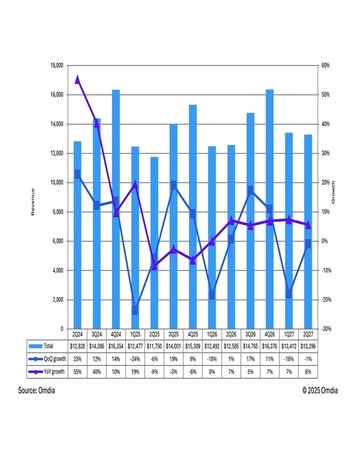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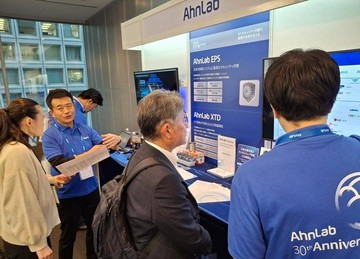









![[포토]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쌀쌀해진 날씨에 두꺼워지는 옷차림](/news/data/20251021/p1065539953453247_118_h2.jpg)
![[포토]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가을 감성 가득한 '수원 황구지천'](/news/data/20251010/p1065540513889794_778_h2.jpg)
![[포토] 추석을 하루 앞둔 5일…차례상 준비에 붐비는 전통시장](/news/data/20251006/p1065539268833600_59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