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암동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내집을 마련하고 싶으세요?그럼 '국토해양부 서민주택 정보 사이트'를 클릭 하세요 '보금자리 주택', '주거복지정책', '전월세지원','주택금융','장기전세 쉬프트'등 서민여러분들의 집장만을 위한 모든것을 친절하고 누구나 알기쉽게 알려 드립니다."
위 글은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10년 초 "서민들의 내집마련은'국토해양부서민주택정보사이트'를 알리는 광고 카피로 사용하던 것이다. 그랬던 국토교통부는 서민 내집 마련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지금 2018년 5월 정부는 바뀌어도 달라 질 것 없는 도시에서의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을 길을 갈수록 힘들어지게 하는 언감생심(焉敢生心) 꿈조차 꾸기 힘든 정책으로 일관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연 소득 대비 9배 가까이 높았다.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가 중위수 기준 8.8배다. 이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표본 8천 가구에 서울시 추가 표본 8천 가구를 더해 총 1만6천169가구를 조사·분석한 결과로 PIR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응답자의 연평균 소득과 집값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분에 대하여도 궁금증은 더한다 개인정보 보호 한다는 전재를 달고 필요한 수치는 발표하면서 정작 필요한 수입이 얼마가 되는 사람이 내집 마련에 성공을 하는지에 대한 평균값을 내 놓아야 조사의 신뢰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특히 서울의 서초, 강남, 용산구의 연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의 PIR은 무려 20.8배, 강남구는 18.3배, 용산구는 13.1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소득 3천 600만원의 소득자가 무려 21년 가까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으면 서초구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조사결과에소 보듯이 서울에 사는 전체 가구의 71.3%는 임대료나 대출 상환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자들 중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전·월세를 사는 임차가구(83.3%)가 자가 가구(71.3%)보다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세입자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은 12.7%(중위수 기준)였다.
세입자 24%(48만 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거나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면 주거비 부담이 과한 수준으로 본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 비율은 42.9%로 1년 새 0.9%포인트 증가해 서울의 자가 점유 비율은 전국 평균(57.7%)보다는 낮은 편이다.
서울 내에선 도봉구(60.2%), 노원구(51.1%), 양천구(50.5%)의 자가 점유율이 높았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1%,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서울이 47.9%로, 전국 평균(60.4%)보다 낮았다. 월세가구 비중은 청년 가구, 1인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조사표 중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에는 15.5%, 15년 넘은 주택에는 63.9%가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76.8%로 전국 평균(82.8%)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 가구는 68.3%가 주택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보다 주택 보유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데일리매거진DB
이같은 서민들의 집없는 섫음을 해결하기 보다 정부는 잇따른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고있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30년을 넘게 몸 담았다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서민들의 집장만에‘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십 수백채의 집을 가진 있는자들에게 더큰 특권을 주는 것이나 마찮가지다" 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개를 갸웃 거리게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다.
[편진자 註]
※ PIR (Price Income Rate) / Price Income Rate의 약자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가리킨다. PIR은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집값 상승이나 하락세를 가늠할 때 소득 수준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로 나타낸다. 즉, PIR이 10배라면 10년치 소득을 모두 모아야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PIR 비율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은 길어진다.
※ R.I.R (Rent Index Ratioin) / Rent Index Ratioin의 약어. 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출처/다음 백과]
※ DSR (debt service ratio) /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출처/[출처/다음 백과]]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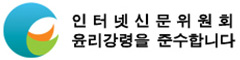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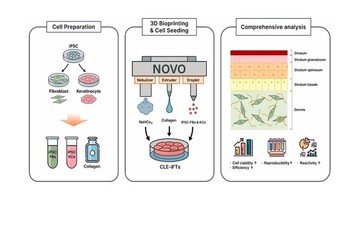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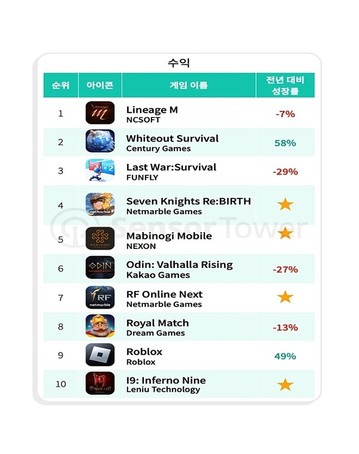














![[포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매몰자 수색 및 구조 작업](/news/data/20251107/p1065551812168717_340_h2.jpg)
![[포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news/data/20251104/p1065598588164448_200_h2.jpg)
![[포토]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쌀쌀해진 날씨에 두꺼워지는 옷차림](/news/data/20251021/p1065539953453247_118_h2.jpg)




